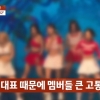부희령 소설가
그 시절 내내 마스크는 나에게 애물단지였다. 마스크를 한다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여러 긍정적 실험 결과와 증언이 이어졌지만, 의심 많은 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했다. 솔직히 벌금을 물거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공원을 걷고 산에 오를 때도 마스크를 해야 한다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몰래 마스크를 내리다가도 출퇴근길의 숨 막히는 대중교통 속 사람들도 있음을 상기했다.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철가면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리라 예상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약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왜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는지 몹시 궁금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회사원에게 물었다. 어차피 실내로 곧 들어가야 하니까 귀찮아서 안 벗는다고 했다. 아직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는 꼬마에게 마스크를 씌운 젊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여전히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버스 정류장에 모여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다. “몰라요”라고 말하며 외면했다. 의기소침해져 중얼거렸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니. 문득 팬데믹 초기에 버스 기사나 편의점 직원에게 마스크 쓰라는 지적을 받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음을 떠올렸다. 획일적 통제에 대한 저항일지도 모른다. ‘쓰라고 하니 썼지만 벗으라면 얼른 벗을 줄 알았더냐. 벌금도 없는데’라는 속셈인가.
얼마 전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속 인물이 인공지능(AI)이 자신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페이스페인팅을 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 흥미로웠다. 혹시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데이터로 수집되는 게 두려워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걸까? 하지만 AI는 마스크를 한 얼굴을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AI를 교란하려면 빛을 굴절시키는 투명한 렌즈 형태의 마스크나 LED가 부착된 고글 같은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알고 보면 현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한낱 데이터로 취급되는 상황에 저항하려면 가까운 미래에는 특수한 마스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2022-06-1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