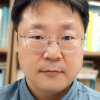오래 전, 경찰서를 출입하다 만난 이웃 신문사의 C기자는 열정이 대단했다. 틈만 나면 형사들의 수사 현장을 따라다녔다. 그즈음 서울 강남에서 어린이 유괴사건이 터졌다. 유괴사건은 보도준칙에 따라 어린이가 무사히 구출되거나, 사망이 확인돼야 기사화할 수 있다. C기자는 경찰의 비공개 수사 때부터 사건을 추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어린이가 유괴범에게 생명을 잃어 공개 수사로 전환되는 바람에 특종을 놓쳤다. 사건을 까맣게 몰랐던 다른 기자들은 몰래 취재한 C기자를 “의리 없다.”며 힐난했다. C기자는 내게 복잡한 심사를 털어놓으며 “나는 ‘인간’보다 ‘기자’가 되겠다.”고 했다. 기자끼리 얄팍한 의리보다 기자정신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었다. 이 말은 ‘생각 없는 기자’였던 나를 일깨웠다. 그후로 ‘기자냐, 인간이냐’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의 말을 떠올리곤 했다.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취재현장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절친한 취재원의 비리나 부정을 기사화할 때는 인간적인 갈등이 말도 못한다. ‘엠바고’(비보도)를 원하는 취재원을 부득이 ‘배반’해야 할 때도 며칠 동안 번민한다. 취재 현장에서 위급한 생명과 맞닥뜨렸을 때도 ‘기자와 인간’의 사이를 헤맨다. ‘한강에서 투신자살하려는 사람을 봤을 때 취재부터 할 건가, 생명을 먼저 구할 건가.’는 사진기자들의 입사 면접시험 단골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기자로서 평소에 직업관과 인생철학을 확고하게 심어두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며칠 전, 미국 ‘뉴욕포스트’란 신문이 1면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한인(韓人)의 사진을 실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장 사진은 이 신문의 프리랜서 기자가 찍었다. 제목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이 남자는 곧 죽는다’, ‘죽을 운명에 놓였다’(Doomed)고 달았다. 50대 한인은 흑인의 난행을 제지하다가 밀려서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몰라라 했다. 사진기자는 특종에 눈이 멀어 10~15초 동안 카메라 플래시만 터뜨렸다고 한다. 기사가 나간 뒤 구조를 외면한 기자는 물론 신문사에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다.
특종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멍청한 기자’가 동서(東西)에 어디 한둘이랴. 기자와 인간 사이는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권력과 비리 앞에서는 ‘기자’를, 약자와 생명 앞에서는 ‘인간’을 과감하게 선택하면 적어도 큰 욕은 먹지 않는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취재현장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절친한 취재원의 비리나 부정을 기사화할 때는 인간적인 갈등이 말도 못한다. ‘엠바고’(비보도)를 원하는 취재원을 부득이 ‘배반’해야 할 때도 며칠 동안 번민한다. 취재 현장에서 위급한 생명과 맞닥뜨렸을 때도 ‘기자와 인간’의 사이를 헤맨다. ‘한강에서 투신자살하려는 사람을 봤을 때 취재부터 할 건가, 생명을 먼저 구할 건가.’는 사진기자들의 입사 면접시험 단골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다. 기자로서 평소에 직업관과 인생철학을 확고하게 심어두라는 취지였을 것이다.
며칠 전, 미국 ‘뉴욕포스트’란 신문이 1면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한인(韓人)의 사진을 실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장 사진은 이 신문의 프리랜서 기자가 찍었다. 제목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이 남자는 곧 죽는다’, ‘죽을 운명에 놓였다’(Doomed)고 달았다. 50대 한인은 흑인의 난행을 제지하다가 밀려서 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몰라라 했다. 사진기자는 특종에 눈이 멀어 10~15초 동안 카메라 플래시만 터뜨렸다고 한다. 기사가 나간 뒤 구조를 외면한 기자는 물론 신문사에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다.
특종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멍청한 기자’가 동서(東西)에 어디 한둘이랴. 기자와 인간 사이는 애매할 때가 적지 않다. 하지만 권력과 비리 앞에서는 ‘기자’를, 약자와 생명 앞에서는 ‘인간’을 과감하게 선택하면 적어도 큰 욕은 먹지 않는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2-12-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