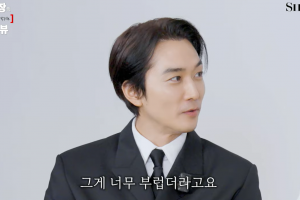한필원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도시를 개발하느라 땅을 파다가 유구가 나오면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으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해야 한다. 방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등 세 가지다. 이 가운데 문화재를 실제로 보존하는 방법은 현지보존뿐이다. 이전보존은 엄밀히 말하면 보존이 아니라 옮겨서 재현하는 것이다. 유구는 대지 위에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 자체가 파괴다. 또한 모든 역사적 장소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구의 자리를 옮기면 문화재로서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사라진다.
얼마 전까지 현지보존 결정이 내려지면 개발자는 지뢰를 밟은 심정으로 유구를 노려보곤 했다. 유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복토(覆土)해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해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구를 다시 덮고 그 위에 보호층을 만드는 복토보존을 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으나 지하층은 만들 수 없다. 도심의 고층 건물에서 지하층은 대개 1, 2층 다음으로 임대료가 비싸서 그것은 큰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유구를 노출해 보존할 경우 새 건물의 공간 활용이 제약받기 쉽다.
그동안 도시 개발자들은 문화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현지보존을 가장 난감하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은 신축 건물의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보았던 개발시대의 산물이다. 경제 저성장이 이어지고 도시화가 정점에 이른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제 짓기만 하면 분양이나 임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료 하락을 막기 위해 인접한 건물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건물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 거주환경과 매력도다. 거주환경은 친환경 성능 등을 갖추는 건축 기술로, 매력은 좋은 건축 디자인으로 확보된다. 그런데 건축 기술과 디자인의 수준은 점차 상향평준화돼 이 두 측면에서 건물이 차별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 오래된 역사의 흔적인 유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것은 큰 관심거리가 되어 건물에 특별한 매력과 품격을 더해 주고 건물주의 이미지까지 상승시켜 준다. 이러한 매력과 좋은 이미지는 분양가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그 건물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
문화유산과 도시 개발을 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는 사고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작년 10월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열린 유엔 해비탯3 회의에서는 앞으로 20년간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한 ‘새로운 도시 의제’를 채택했다. 그중 한 항목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인도의 델리에서는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총회와 함께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은 ‘유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네 개의 소주제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소주제가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유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통합’이다. 이 소주제에 일백수십 편의 논문 발표가 신청됐다.
필자는 방금 논문 초록 심사를 끝냈는데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통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역사 도시에 등장하고 있는 고고학적 현대 건물이라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건물 유형이다. 이제 문화유산은 도시 개발의 지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조상이 준 선물이다.
2017-04-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혼 안 해도 가족” 정우성 아들처럼…혼외자 1만명 시대 [김유민의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11/25/SSC_20241125094249_N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