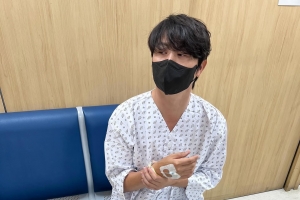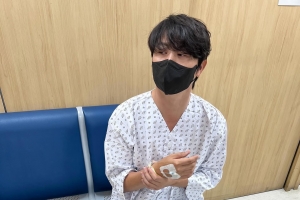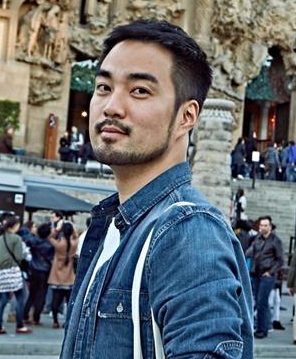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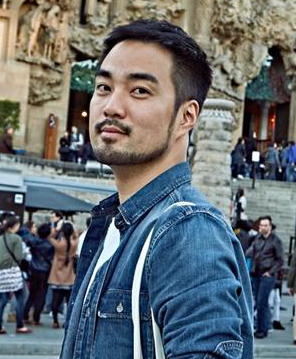
장준우 셰프 겸 칼럼니스트
가끔 고객 중 직접 만든 마요네즈를 맛보고는 감탄을 연발할 때가 있다. 민망함에 못 이겨 시선 둘 곳을 못 찾기도 하는데, 겸손해서라기보다 정말로 대단찮기 때문이다. 비범한 비법이나 특별한 기술 없이도 5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그럴듯한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다. 만약 교육과정에 마요네즈 수업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맛있는 마요네즈가 기본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영역의 마요네즈를 먹고 감탄할 일도 없고, 그걸 만든 사람이 낯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그런 세상 말이다.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한 요리가 아니라 몇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면 좀더 살 만하지 않을까. 사진은 다양한 소스를 요리에 플레이팅하고 있는 셰프들.
중세와 근대 프랑스 요리사들은 상류층의 지원으로 비용과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가장 맛있는 맛의 정수를 뽑아내는 데 주력했다. 현대에 와서는 과정과 비용이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전통 프렌치 소스를 제대로 만들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소스는 전문 식당에 맡겨 두자. 간단하면서도 맛보면 행복감을 즉시 안겨 주는 소스를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다. 바로 페스토와 드레싱 소스다.
페스토는 재료를 기름과 함께 거칠게 갈아 만든 일종의 서양식 양념장이다. 가장 잘 알려진 페스토 소스는 이탈리아 제노바식 바질 페스토다. 바질 잎, 파르미지아노 치즈, 잣과 올리브유를 한데 갈아서 만드는데 빵 위에 올려 잼처럼 발라 먹거나 파스타에 넣어 먹는 등 다용도로 쓰인다.
제노바식 바질 페스토가 탄생한 연유는 단순하다. 재료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 건너 시칠리아에는 트라파니식 페스토 소스가 있다. 일설에 따르면 트라파니로 교역을 온 제노바 사람들이 고향의 맛이 그리워 현지 재료로 페스토를 만들었는데 잣 대신 아몬드와 흔한 토마토를 넣어 만든 게 트라파니식 페스토라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새겨들어야 할 건 상황에 따라 재료를 바꿔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질 페스토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향을 내는 바질과 마늘, 간과 감칠맛을 담당하는 치즈와 안초비, 질감을 만들어 주는 잣 그리고 이들을 한데 어우르는 올리브유다. 각 요소에 비슷한 성질의 재료를 치환하면 창의적이고 특별한 페스토를 만들 수 있다. 바질은 여름에 풍성하게 자라지만 흔한 재료는 아니니 시금치나 고수를 넣어도 좋다. 감칠맛을 내는 안초비 대신 어간장을 넣어도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 안심하자. 원하는 대로 맛의 조합을 내는 재미가 있다.


명이를 이용해 만든 그린소스를 곁들인 대구 요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선 남자들이 재력이나 완력만큼 요리 실력을 뽐낸다.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건 맛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뜻이다. 맛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음식 수준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이 땅의 모두가 어느 수준 이상의 요리를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억지로 세계화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음식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자기만의 비법 소스 같은 것을 하나쯤 만들 줄 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살 만한 세상이지 않을까.
2022-09-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