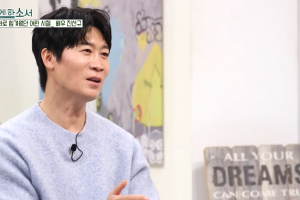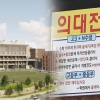이경우 어문부 전문기자
컴퓨터로 신문을 제작하는 시대. 기계가 사람을 더 재촉한다. 이전 시대에도 정보는 빠르게 전달해야 했지만, 지금은 더욱 그래 보인다. 기계와 같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기사의 정확성 못지않게 신문 제작 현장에선 신속성도 필수다. 신속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정보들이 곳곳에 쌓인다. 이럴 땐 쓰기도, 글 다듬기도, 읽기도 빨라진다.
나는 거의 매일 신문 기사를 읽는다. 신문에 등장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등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거기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꼼꼼히 챙기며 읽어야 한다. 그래야 쉽고 올바른 표현들로 이뤄진 기사를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
내가 신문사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사의 언어 표현, 정보가 오류 없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단어로는 ‘교열’이다. 나는 기사를 빠르게 읽고 수정하는 편이다. 30년 정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런데 교열은 일반적인 읽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글자 하나하나는 물론 낱말들로도 봐야 한다. 구절을 보고 문장을 같이 살펴야 한다. 문장과 문장이 잘 이어지는지도 따져야 한다. 그 가운데 아는 상식선에서 정보의 오류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교열이 얼추 이뤄진다.
어느 날 같은 일을 하는 후배가 물었다. “선배,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도요.” 자신은 일하는 속도가 잘 붙지 않는다는 거였다. “글을 보는 눈의 높이. 그리고 눈과 글자의 거리가 꽤 중요한 거 같어.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세가 중요해 보이더라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개별적인 단어와 내용이 같이 들어오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 같어. 자기에게 맞는 거리를 잘 찾아보라구.”
모든 읽기는 대상을 아는 과정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려면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된다. 코로나19에만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다. 곳곳에서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2021-10-1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