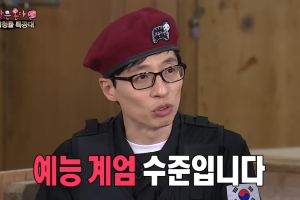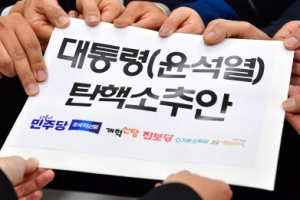시골 고향 마을 뒤편에 꽤 넓은 갯고랑이 있었다. 놀이터였다. 밀물과 썰물에 맞춰 노는 방식이 달랐다. 바닷물이 차면 망둥어 낚시를 했다. 대나무에다 납을 녹여 만든 추와 바늘을 단, 말 그대로 수제 낚싯대였다. 낚싯바늘만 샀다. 바닷물이 빠지면 얕은 곳에 들어가 손으로 돌 틈을 더듬어 고기를 잡거나 미끄럼을 탔다. 갯벌 미끄럼은 끝이 물속인 까닭에 학교 미끄럼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온몸은 개흙 범벅이 됐다. 팔을 넣어 게를 잡는 재미도 쏠쏠했다.
갯고랑은 삶의 터전이었다. 심한 가뭄이 들면 어른들은 갯고랑을 막았다. 가마니에 흙을 넣어 보를 쌓았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게 갈랐다. 이웃 동네 어른들까지 나섰다. 어린 눈엔 댐이었다. 가뭄이 가면 보를 무너뜨렸다.
갯고랑이 사라졌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초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던 갯고랑은 어디에나 흔한 개천으로 바뀌었다. 갯벌은 논으로 변했다. 동네 어른들은 소금기가 빠지자 농사를 지었다. 10대 때였으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올해부턴 남아도는 쌀 탓에 갯고랑의 논도 놀린단다. 갯고랑이 지금껏 보전돼 있었으면…. 그리움이 짙어지니 아쉬움도 커진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갯고랑은 삶의 터전이었다. 심한 가뭄이 들면 어른들은 갯고랑을 막았다. 가마니에 흙을 넣어 보를 쌓았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지 않게 갈랐다. 이웃 동네 어른들까지 나섰다. 어린 눈엔 댐이었다. 가뭄이 가면 보를 무너뜨렸다.
갯고랑이 사라졌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초입을 아예 막아 버렸다. 넓은 들판을 가로지르던 갯고랑은 어디에나 흔한 개천으로 바뀌었다. 갯벌은 논으로 변했다. 동네 어른들은 소금기가 빠지자 농사를 지었다. 10대 때였으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올해부턴 남아도는 쌀 탓에 갯고랑의 논도 놀린단다. 갯고랑이 지금껏 보전돼 있었으면…. 그리움이 짙어지니 아쉬움도 커진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6-02-2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