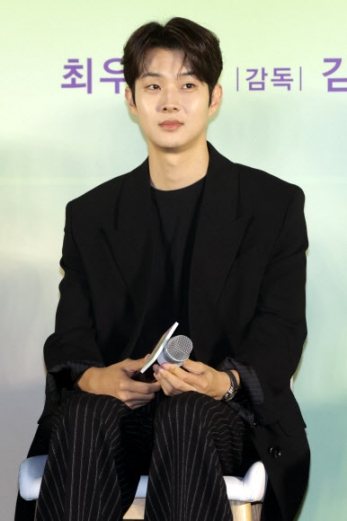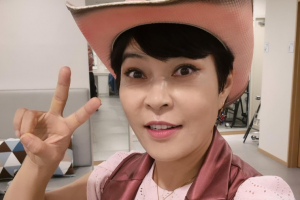톰프슨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기란 쉽지 않다. 톰프슨의 글을 영화에 담는 것은 톰프슨의 자유롭고 거친 영혼을 병에 가두는 것과 같다.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발길을 뒤따르는 건 힘겨운 작업이며 시스템에 대한 반골 정신에 꼼꼼히 살을 입히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일례로 영화 ‘라스베이거스의 공포와 혐오’는 약에 취한 인물의 영혼 아래로 자기를 희생하고 말았다. 인물의 몽롱한 정신에 다가갔을지는 모르지만 원작의 다른 맥인 현실을 대하는 시선이 숨 쉴 틈을 마련해 주진 못했다. 이에 비해 ‘럼 다이어리’는 비교적 담담하게 흐름을 유지하는 편이다. 이야기와 주제의 전달에는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그만큼 톰프슨 작품 특유의 매력을 전달하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인물이 종종 술에 절고 약에 취해 흥청거리는 양 행동하지만 톰프슨은 진실을 찾는 예리한 태도를 절대 거두지 않았다. 그는 작가이기 이전에 저널리스트였다. ‘라스베이거스의 공포와 혐오’와 ‘럼 다이어리’는 공히 ‘아메리칸 드림’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전자가 추락 직전의 아메리칸 드림에 메스를 들이댔다면 후자는 타자의 땅까지 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조롱한다. ‘럼 다이어리’는 타락, 탐욕, 소비에 기반을 둔 아메리칸 드림이 기실 냉혹한 폭군의 변명임을 까발린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톰프슨이 엿 같다고 욕한 세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럼 다이어리’의 추악한 인물인 부패한 사업가를 흉내 내는 한국인 투기꾼이 세계 곳곳을 떠도는 현실을 보자. 톰프슨은 그런 인간을 ‘개자식’이라 불렀다. 문제는 그런 작자들이 정작 자신이 몹쓸 인간임을 모른다는 데 있다. 20일 개봉.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