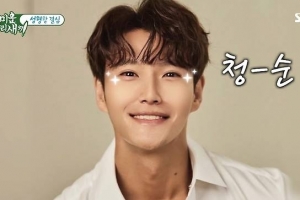울산 출신 어부… 안용복에 가려 빛 못봐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던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의 주역에 안용복(安龍福·생몰연대 미상)뿐 아니라 울산 출신 어부 박어둔(朴於屯·1661~?)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용복 개인의 영웅적 활동에 국한해 설명했던 ‘울릉도쟁계’(1693·숙종 19년)의 기존 인식에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송휘영(49)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22일 울산광역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울릉도·독도 수호 박어둔 재조명 연구 학술대회’에서 “교과서 등에 울릉도쟁계가 안용복 개인의 영웅담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안용복과 함께 1차 도일(渡日)에 참여, 훗날 일본 바쿠후(幕府)가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인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박어둔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박어둔의 울릉도·독도 수호활동의 관광 자원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1693년 40여명의 어부와 울릉도에 갔다가 일본 어부들에게 돗토리성으로 강제연행됐던 울산의 박어둔과 부산의 안용복이 일본 바쿠후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공식문서를 받아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이들이 벌인 이른바 ‘울릉도 쟁계’ 사건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특히 울산부 청량면 목도리(현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는 박어둔이 출생해 염전일과 어로활동 위주로 생계를 영위해 왔던 곳”이라며 “목도리 일대 처용암과 목도, 개운포성지, 외항천 갈대생태공원 등 박어둔의 일상생활 무대가 됐던 온산항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박어둔 해양테마파크’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같은 연구소 김호동 교수도 ‘울릉도·독도수호 활동에 있어서 울산의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숙종조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수만명에 달하는 등 토지로부터 이탈한 민중들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바다로, 국경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겨 ‘울릉도 쟁계’ 등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박어둔과 울산지역 사람들의 지속적인 울릉도·독도 출어활동은 일본이 이들 지역이 조선 땅임을 인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2-24 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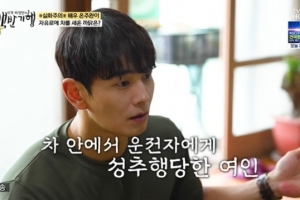

















![21대 국회 ‘아니면 말고 식 입법’… 의원 법안 10개 중 7개 폐기·철회[한규섭의 데이터 정치학]](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24/SSC_20240624010419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