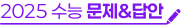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오디션 현장을 가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흥인동 충무아트홀 로비는 한산했다. 공연이 없는 시간이라 서너 명 정도 있을 뿐이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공기가 점점 더워졌다. 남녀 수십 명이 내뿜는 체온이 가득했다. 이들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또는 서성이거나 창밖을 보면서 쉴 새 없이 중얼거렸다. 자신의 진가를 알아봐 줄 사람들 앞에서 기량을 뽐내고, 선택받을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지난 20일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오디션에서 노래 심사를 통과한 여성 지원자들이 안무 심사를 위한 동작을 익히고 있다.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이날 EMK뮤지컬컴퍼니가 오는 10월 초연하는 유럽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의 앙상블 오디션 현장을 찾았다.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남녀 각 200명 가운데 일부 그룹이 노래와 안무 심사를 받는 날이다. 넓은 연습실 한쪽에는 아드리안 오스몬드 연출을 비롯해 김문정 음악감독, 이란영 협력연출 및 안무감독, 구민경 협력음악감독 등이 매서운 눈빛으로 앉아 있다. 이날 모든 지원자는 30초짜리 지정곡을 불렀다. 그러나 지원자마다 ‘오디션의 기억’은 달리 새겨졌을 터. 노래만 하고 온 이도 있지만, 다른 기회를 갖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자유곡을 시키거나, 연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① 노래 오디션에 참가한 남성 지원자가 연출, 음악감독, 안무감독 등 심사위원들 앞에서 지정곡을 부르고 있다. ② 노래 오디션이 끝난 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를 선별하기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김문정 음악감독, 통역, 아드리안 오스몬드 연출, 이란영 안무감독. ③ 이날 안무 오디션에 이어 앙상블의 조화를 보기 위한 노래 심사를 다시 한 후에야 오디션이 마무리됐다.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EMK뮤지컬컴퍼니 제공
EMK 관계자는 “노래 심사에서 배역에 대한 질문을 던지거나 다른 노래를 시킬 때도 있다. 관심을 둔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합격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안무 심사가 이어졌다. 30분 동안 무용을 배운 뒤 지정안무와 자유안무를 선보이는 방식이다. 동작 순서를 익히기도 짧은 시간이라 박자를 놓치기 일쑤다. 이란영 감독은 “순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하고, 보여 줄 모습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오디션은 노래 심사를 다시 한번 한 뒤 끝맺었다. “이 작품은 마리와 마그리드, 두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앙상블이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연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오디션은 공연 제작자들에겐 ‘성패의 첫 관문’으로 꼽힌다. 물론 연출, 무대, 음악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는 건 역시 무대 위 사람들이다. 주연은 물론이거니와 합창과 군무를 이끄는 앙상블 선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국내 초연인 작품에서는 앙상블의 역할이 더 크다. 이들이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야 공연의 가치가 상승한다.
보통 제작사들은 1차 서류 전형을 거쳐 2차 노래와 안무, 3차 연기 순으로 오디션을 진행한다. 대부분 1차는 연출과 음악감독, 안무감독이 모여 서류를 본다. 재미 삼아 지원했다거나, 경력이 거의 없어 검증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르는 단계다.
오디션 유형은 연출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오스몬드 연출은 노래와 안무, 연기를 순서대로 보는 ‘정석’이다. 반면 ‘레베카’, ‘황태자 루돌프’ 등을 맡은 로버트 조핸슨 연출은 워크숍 유형에 가깝다. 그룹별로 안무, 연기 등을 시키면서 조화를 판단한다.
연출팀의 성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오디션 기간이다. 이번처럼 3~4일에 걸쳐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오리지널 연출팀이 들어오면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공연한 라이선스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다. 2012년 열린 오디션에 2000여명이 지원했다. 7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최종후보를 뽑고 영국 프로듀서 캐머런 매킨토시에게 영상을 보내 낙점받았다. 그렇게 장발장이 된 인물이 지난해 뮤지컬 상을 휩쓴 정성화다. 올해 말에 공연하는 ‘원스’ 역시 지난해 11월에 시작한 오디션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상당수 공연 제작사들은 주연급을 지명 오디션으로 뽑는다. 인지도 있고, 팬층이 두꺼운 배우들을 중심으로 오디션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해외 제작사가 주도하는 오디션은 인기보단 실력이 선발의 척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오디션의 묘미이자, 배우들에게는 쾌감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날 ‘마리 앙투아네트’ 오디션에 참가한 조성지(37)씨는 그런 이유로 ‘스위니 토드’(2007)를 기억한다. 작지만 강렬한 피넬리 역을 위해 7차까지 오디션을 보면서 그와 다른 동료가 접전을 벌였다. 사실상 내정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올라가지 않는 음역까지 뽑아내면서 마침내 배역을 따냈다. 그는 “극한의 상황을 이겨 내고 결국 손에 쥐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명쾌하게 말했다.
2006년 ‘아가씨와 건달들’로 뮤지컬계에 발을 들인 배희진(34)씨는 “오디션도 내 직업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전엔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나를 왜?’라는 의문을 가졌다”며 “언제부터인가 오디션 지원자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한 경쟁자이자 동료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가 오디션을 ‘동창회’라고 말하는 이유다. “주연 욕심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보다는 오랫동안 무대에 남고 싶다는 바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디션에서 선택받지 않았다고 해도 예전처럼 좌절하지 않아요. 길게 보면, 가끔 쉬는 날을 갖는 것도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이건 조급해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 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4-01-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