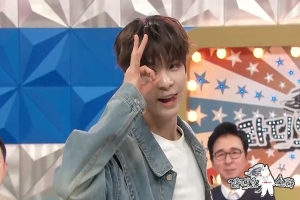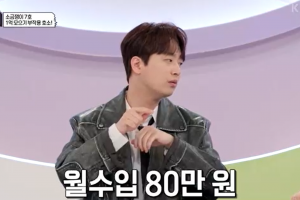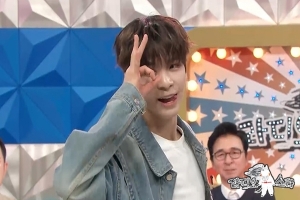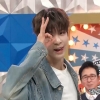휴가의 사회학
흔히 직장인에게 휴가는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만난 ‘오아시스’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휴식의 시간이다. 업무의 공백이지만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여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노동자로서 갖는 중요한 권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휴가 가기 참 어렵다. “휴가 가겠다.”고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뿐 아니라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정당한 권리 행사에 왜 눈치를 봐야 할까. 업무가 집단적·협력적 성격이 강한 탓이다. 주로 교대 근무조 편성, 고정 근무 배치 등 집단 작업의 형태이다 보니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이 구성원으로서의 미덕으로까지 여겨질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에서도 응답자 42.9%가 ‘연차휴가를 소진 못하는 이유’를 업무의 집단적·협력적 성격으로 돌렸다. 이어 ‘연차수당 선호’(27,7%), ‘업무과다’(24.4%)를 꼽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업무의 집단적·협력적 성격은 인력을 최소화하려는 경영진의 전략 때문”이라면서 “달리 말하면 업무량에 비해 적절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뿌리 깊은 ‘성과주의’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휴가가 업무의 연속성을 깨트려 업무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 상당수가 “휴가로 성과가 뒤쳐지면 인사평가에 반영돼 승진과도 직결된다는 분위기여서 휴가를 반납하고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금융산업 종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노동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39.4%가 ‘성과주의 문화’를 꼽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업무 성과가 반드시 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휴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휴가는 긍정적 측면이 훨씬 많다. ‘잠만 자는 곳’으로 여겨지는 가정을 잠시나마 되돌아볼 수 있어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혼율을 낮추고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여가 시간을 이용한 취미 활동으로 개인의 사회성을 높이는 계기도 되며 직장인들의 소비 시간을 늘려 내수 시장 경기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진단도 적지 않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휴가를 노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7-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