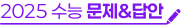대학 자퇴 후 꿈 접은 김유진씨
김유진(가명·24·서울 양천구)씨는 중국 전문가의 꿈을 품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2010년 자퇴했다. 김씨는 “엄마가 한 달에 100만원을 벌어서 고등학생 동생과 나까지 세 식구를 거두는 상황에서 정규 대학에 다닌다는 것은 사치였다”면서 “당시엔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와 가난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고만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이란 큰 나라에 가면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나설 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의 가정이 원래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는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남들처럼 학원도 다니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줄곧 1, 2등을 다퉜다.
그런데 그해 겨울방학 직전 아버지의 가게가 부도나고 이후 아버지가 가출하면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중산층에서 한순간에 빚쟁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것이다.
어머니가 돈벌이에 나섰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밥과 간식을 해 주며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김씨는 학원을 그만뒀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한참 성적이 밑이었던 친구가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학원과 담을 쌓은 김씨의 성적은 중위권으로 떨어졌다.
꿈 많은 여고생에게 세상은 불공평했고 도움을 받을 곳도, 어려움을 나눌 곳도 없었다. 빈곤층이었지만 가출한 아버지가 있어서 한 부모 가정 지원도 받지 못했다.
중국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7년 어렵게 대전의 D대학 중국학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중국 전문가란 꿈이 있어서 그때는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3인 남동생의 장래와 자신의 학비 부담 때문에 그는 결국 자퇴했다. 김씨는 지금 파견직 사원으로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떼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굴레인 것 같아요.” 김씨의 얘기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1-0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