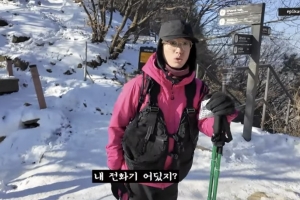양자물리학 난제 ‘슈뢰딩거의 고양이’
내 소개를 하기 전에 수수께끼 하나만 풀어 보자고. 재미있을 거야.
위키피디아 제공

슈뢰딩거의 고양이 패러독스를 실제로 재현하면 대략 이런 모습이다.
위키피디아 제공
위키피디아 제공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1935년 독일에서 발간한 ‘자연과학’이란 과학저널에 쓴 ‘고양이 패러독스’야. 흔히 ‘슈뢰딩거의 고양이’ 문제라고도 부르지. 난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어빈 슈뢰딩거(1887~1961년)라네. 내가 세상을 뜬 지 딱 55년이 됐군.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발전시켜 파동방정식을 제안하고 파동역학을 만들어 양자물리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텄지. 그 덕분에 193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네.
자, 앞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 답이 뭐라고 생각하나. 혼란스럽다고? 당연하지. 답을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물리학적 재능이 무척이나 뛰어난 사람이지. 일반적으로 상자 속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아 있거나 어느 한 상태라는 답을 하겠지.
그렇지만 코펜하겐 학파로 불리는 양자물리학자들은 상자를 열어 관측을 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죽은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라는 답을 내놨지. 사실 이런 설명은 상식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많은 과학자가 여러 형태의 실험으로 사실임을 증명했다네. 하지만 난 그런 확률적 해석을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어. 고양이 패러독스도 양자물리학의 확률론이 말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는데, 도리어 양자물리학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자리잡아 버렸지 뭔가. 참 세상일은 알 수 없는 것 같아. 아인슈타인 박사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과 끊임없는 토론을 하며 주장을 펼쳤지. 그 덕분에 양자물리학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지금처럼 발전한 거야.
과학만 그렇겠나.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고 상대와 토론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나 싶구먼.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6-01-0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