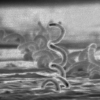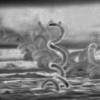한나라당 개헌특별기구에 친박근혜(친박)계가 사실상 ‘집단 보이콧’할 조짐이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22일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맞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개헌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친박계 의원들도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다만 친박계가 개헌 논의 자체에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필요는 없다는 게 내 판단이자 박근혜 전 대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 16일 “(개헌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개헌 기구를 두기로 한 지도부 결정은 존중하되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리두기’인 셈이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는 물론 기본권 등의 문제까지 다루면 다양한 이해집단이 거북등처럼 갈라설 것”이라면서 “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도 “한마디로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를 보는 친이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 친이계 의원은 “개헌 기구에 참여하면 주목받는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면서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개헌 기구의 주도권을 놓고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 대표는 ‘기구 구성을 원내대표가 맡냐.’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할 일은 이제 없다.”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온병·자연산 발언과 당청 갈등설 등으로 위축됐던 안 대표가 개헌 기구를 통해 친이계를 등에 업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개헌론의 불씨를 살린 ‘일등공신’인 김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했고, “개헌이 정략적으로 추진되면 온 몸으로 막겠다.”며 안전판 역할까지 했다.
한 의원은 “특위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5월 전후로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22일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맞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개헌 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친박계 의원들도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다만 친박계가 개헌 논의 자체에 지나치게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질 필요는 없다는 게 내 판단이자 박근혜 전 대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지난 16일 “(개헌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언급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개헌 기구를 두기로 한 지도부 결정은 존중하되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리두기’인 셈이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개헌 논의에서 권력 구조는 물론 기본권 등의 문제까지 다루면 다양한 이해집단이 거북등처럼 갈라설 것”이라면서 “기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도 “한마디로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를 보는 친이계의 시선은 다르다. 한 친이계 의원은 “개헌 기구에 참여하면 주목받는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나.”면서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개헌 기구의 주도권을 놓고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안 대표는 ‘기구 구성을 원내대표가 맡냐.’는 질문에 “원내대표가 할 일은 이제 없다.”면서 “앞으로 야당과의 접촉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보온병·자연산 발언과 당청 갈등설 등으로 위축됐던 안 대표가 개헌 기구를 통해 친이계를 등에 업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개헌론의 불씨를 살린 ‘일등공신’인 김 원내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했고, “개헌이 정략적으로 추진되면 온 몸으로 막겠다.”며 안전판 역할까지 했다.
한 의원은 “특위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5월 전후로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