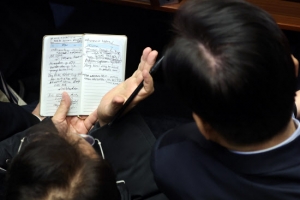두 ‘영웅’을 실은 운구 차량이 이날 오전 10시께 경북도청 동락관에 도착하자 도열한 소방관들은 거수경례로 맞았다.
유가족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영결식장까지 운구행렬 내내 두 청년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했다.
김 소방장의 모친이 “엄마는 우리 수광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어쩔래, 보고 싶어 어떡하나”라고 흐느끼자 박 소방교의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간 아내의 곁에서 눈물을 삼켜왔던 두 부친도 목 놓아 울었다.
생전 두 소방관이 몸담았던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대 동료들 역시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다.
주황색 활동복을 입은 채 두 청년에게 경례를 한 대원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떨구었고, 일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아픔을 삼키는 모습이었다.
이들의 마지막 길에는 유족, 친지, 경북도지사, 소방청장, 도의원 등 1천여명이 함께했다.
영결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묵념과 약력 보고, 1계급 특진·옥조근정훈장 추서, 윤석열 대통령 조전 낭독, 영결사, 조사, 고인께 올리는 글, 헌화와 분향, 조총 발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영결식 후 두 소방관은 문경 지역 화장장인 예송원에서 화장을 거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두 젊은 소방관은 영결식에 앞서 이들이 근무한 문경소방서에서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았다.
두 구조대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께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하늘의 별’이 됐다.
혹시 남아 있을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화염을 가르고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번진 화마를 끝내 피하지 못했다.
김 소방장은 5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500여차례 현장에 출동했다.
박 소방교는 특전사 부사관 출신으로 2년간 400여차례 화재·구급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헌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